작년 수석 졸업생들 인식 변화 뚜렷 "단순잡무만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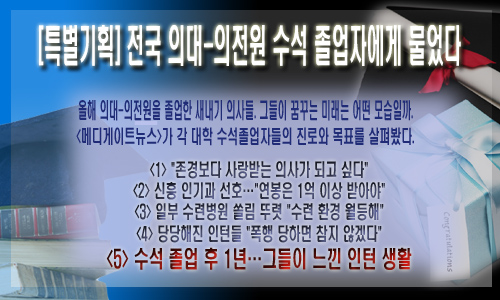
지난해 수련을 마친 인턴들은 과연 1년간의 수련 생활을 어떻게 평가할까?
메디칼타임즈가 2010년도 수석 졸업생들에게 인턴 생활을 하며 느낀 소회를 묻자 이들은 하나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본지가 수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때만 해도 이들은 하나같이 인턴제도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폈지만 1년후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을까. 이들은 1년 간 잡무에 시달렸을 뿐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2010년 지방의 한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친 A씨.
그는 인턴 수련을 마친 소감을 묻자 주저 없이 "인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너무 힘들었다"는 한마디 말로 인턴 1년을 짧게 표현했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잡무'였다.
그는 지난해 설문조사 때만 해도 인턴제를 유지하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순한 잡무도 반복되면 격무되기 마련"
A씨는 "단순 작업의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사실상 매일 당직을 서고, 단순 노무가 반복되면 격무가 되기 마련"이라면서 "대체 인력이 있다면 당연히 인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인턴 1년을 돌아보며 "학생 때 막연히 생각하던 인턴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간호사와의 관계다.
A씨는 "간호사가 인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면서 "인턴들이 간호사의 콜을 받고 달려가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다"고 전했다.
"간호사가 상전…마치 몸종 부리듯 다뤘다"
지난해 또다른 의대를 수석졸업하고 인턴을 수료한 B씨도 A씨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B씨는 "간호사들이 인턴에게 무례하게 구는 때가 종종 있다"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턴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호 직능을 존중해야 하지만 가끔 간호사가 인턴을 마치 몸종 부리듯 대하는 때도 있었다"면서 "인턴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없이 1년을 허비한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지방에서 공부한 B씨는 소위 말하는 '빅 5'에서 인턴을 했다. 그러나 결국 레지던트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규모가 큰 병원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체 인력만 있으면 인턴제 폐지돼야"
C씨도 인턴제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는 인턴을 경험한 후 "일을 대신 해 줄 사람만 있다면 폐지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전했다.
인턴의 일이라는 것이 굳이 6년간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꼭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C씨는 "병원이 값싼 인력을 위해 인턴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지 결코 수련의 제도로서 인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C씨는 "간단한 잡무를 맡아줄 인력이 확보돼야 인턴 제도의 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급작스러운 인턴 폐지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B씨는 "어차피 인턴의 역할은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턴제를 폐지한다 해도 결국 이 일을 처리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