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환자 위급한데도 네달 기다렸더니 허가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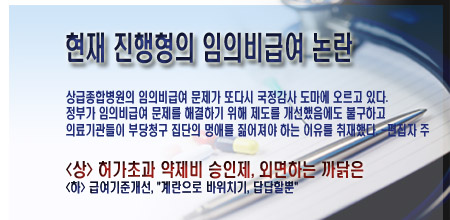
이에 따르면 전국 40여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여 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환불해 줬다는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이낙연 의원은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환자에게 청구한 것을 모두 '부당 청구'로 봤지만 병원들은 이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갖고 진료한 이상 심평원의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해 '부당 청구'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가초과 약제비 승인 신청 늘고 있다"
2008년부터 임의비급여를 막기 위해 '허가초과 약제 승인 신청제'가 마련됐다.
대체약제가 없고 비용효과적이면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허가 초과 약제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심평원 측은 제도 시행 3년이 되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허가초과 약제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는데도 환자에게 허가사항 초과 약제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의도적인 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툭하면 승인 거부에 기한도 길어 속 터진다"
반면 의료계는 아직 허가초과 약제비 승인 신청제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낮은 승인 허가율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전 승인 요청을 위해선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구성해 병원 내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나의 약제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를 준비하기도 버겁다"고 지적했다.
허가 기준을 벗어난 약제가 생길 때마다 IRB를 구성해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심평원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
또 자체 IRB를 거쳐야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RB가 구성되지 않은 병원은 초과 약제비 발생시 임의비급여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B병원 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최종 승인 여부가 나오기까지 평균 2~4달이 걸린다"면서 "승인 비율은 절반에 그쳐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 환자 등 분초를 다투는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해 허가 약제 범위를 넘겨 치료를 하는데 승인 여부를 알기까지 2달 넘게 걸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승인율도 낮아 승인 신청을 기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의비급여 문제 재발 방지 위해선…
심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사전승인제도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심평원 측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알려줘야 하지만 심사 한건당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는 무리"라면서 "비뇨기과나 피부과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위원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허가초과 약제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낮은 신청 건수와 저조한 승인율이 눈에 띈다.
2008년 8~12월까지 신청 건수는 44건이지만 승인 건수는 26건에 그친다. 2009년은 76건의 신청 건수 중 59건이 승인됐다. 2010년 1~7월까지 48건의 신청건수 중 24건이 승인됐다.
IRB가 설치된 기관은 132개 병원이였지만 정작 허가초과 약제 승인 신청을 한 기관은 23개 병원에 불과했다.
의료계는 "의학적 타당성을 갖고 진료한 것을 부당 행위로 몰아가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편의를 고려한 임의비급여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