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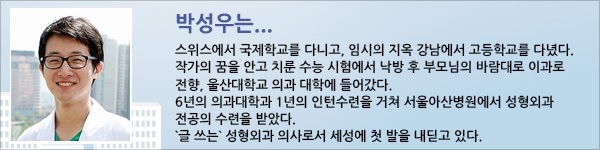
마지막 순간의 위로
간세포암 치료 도중, 갑작스레 발생한 뇌출혈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60대 남자 환자의 트랜스퍼를 가게 되었다. 뇌출혈의 위치로 보나 간암의 진행 상태로 보나 치료보다는 이대로 요양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이었다.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요양 병원에서 요양하자는 것이 보호자의 마지막 결정이었다. 과로와 지나친 과음 때문에 간이 모두 망가졌다고 보호자는 넋두리를 했다.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는 여동생밖에 없어서 앞으로의 치료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응급차를 타고 보호자와 함께 의식이 흐린 환자를 모시고 갔다. 멀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사이 보호자와 많은 대화를 했다. 누워 있던 환자는 자꾸 목이 마른지 계속 나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했다. 술값을 치르면 막걸리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던지 자신의 주머니에서 연신 돈을 찾았다. 보호자는 안타깝게 환자를 쳐다보았다.
보호자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짐작하건데 지금의 처치가 환자에게 최선이라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았다. 더 이상 환자의 곁을 지켜줄 만한 여력이 없어보였던 그녀는 의료진의 결정이 환자를 위한 최선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치료를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나 보다. 보호자에게 이것이 환자 본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말했는데 순간 안도의 빛이 얼굴에 비췄다. 병원에서 다시 병원으로 이사하는 짐 보따리를 잔뜩 짊어진 보호자의 모습이 측은했다.
요양 병원에는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 치료 말기에 이르러 여생을 진통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환자들, 허름한 시설과 턱 없이 부족한 의료진,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도 끝까지 숨을 붙잡는 것이 가족으로서 도리라는 입장이 있다.
고통스러운 치료보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환자에게나 가족에게나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 대립은 병원이란 생사의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존적인 치료만 남은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남은 이들에게는 마음 속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끝까지 소생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택할까? 트랜스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씁쓸했다.
<19편에서 계속>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