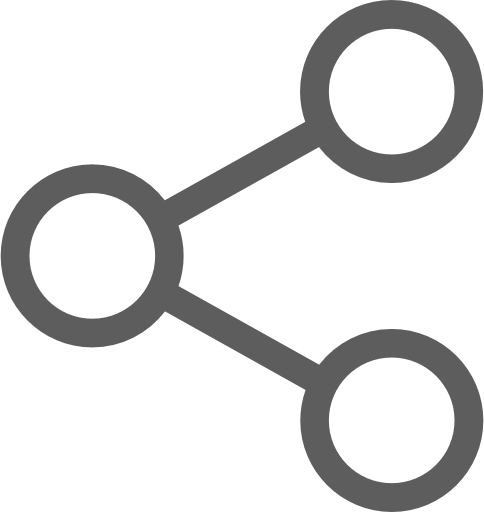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소도포 건선치료제 '자미올(칼스포트리올+베타메타손)' 복제약은 논란의 성격이 다르다.
보통 복제약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인체 내 동등성(오리지널이 100이라면 복제약 80~120)을 입증 후 허가된다. 하지만 '자미올'은 생동성 아래 단계로 평가받는 이화학적동등성만 검증받고 시장에 나온다. 논란의 촉발은 여기다.
심지어 일부 의료진은 '자미올' 복제약의 확신 처방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자미올' 두 성분을 연결시키는 베이스, 즉 용매(솔벤트)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스 기술이 왜 중요할까. '자미올'의 한 성분인 베타메타손은 스테로이드다. 베이스 기술이 달라서 베타메타손 활성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이어진다. 뒷일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자미올' 복제약 논란은 비단 국소도포제 뿐이 아니다.
호흡기 디바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천식·COPD 환자는 치료제를 흡입할 때 디바이스에 따라 흡입량 등이 다를 수 있다. 오리지널과 복제약이 이화학적 동등성이 같아도 환자마다 다른 약물 수용도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식약처는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생동성 예외 치료제 역시 모두 생동성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case by case, 즉 맞춤 시험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굳이 case by case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표준화되고 선진국 수준의 일관된 검증 기준 확립이 우선이다.
한 의료진은 말한다. 서울만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 시험이 이뤄지는 도시임에도 일부 치료제 제네릭 허가 기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고.
낮은 높이뛰기 바를 맨날 넘어봐야 수준은 낮다는 소리다.
이미 5월 1일 기준 '자미올(같은 성분 다이보베트 포함)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 17곳이 허가를 받았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아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힘들다. 복제약도 마찬가지다."
어느 교수의 말처럼 제네릭 불신의 싹을 없애려면 이에 걸맞는 표준화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검증 기준이 우선이고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