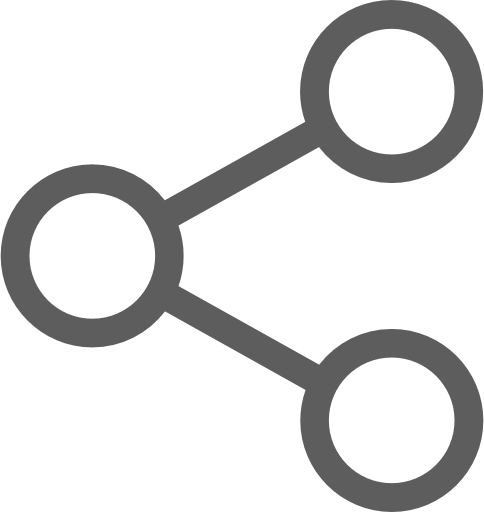평소 자주 술자리를 갖던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고 자주 왕래하던 친척들이 발길이 끊겼다고들 한다.
나 또한 병원 출입기자라는 이유로 가까운 친척에게 "당분간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농반진반 섞인 안부인사를 받았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에 헛웃음과 함께 섭섭함이 스쳤다.
기자가 이 정도인데 환자의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의사라면 얼마나 씁쓸할까. 게다가 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숙주로 취급되는 것을 지켜보면 억울함마저 들 것이다.
어쩌면 이들이 메르스 사태의 숨겨진 피해자가 아닐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일을 키운 것은 정부였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일단 덮고 보자는 식의 안일하고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지자 정부는 민-관대책 세미나를 여는 등 의료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대책 마련에 뛰어들면서 일선 현장에선 변화가 시작됐다.
의료기관명 공개를 통해 국민 스스로 격리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어도 의심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게 됐으며 메르스 전담 의료기관 구축을 검토하게 됐다.
또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나마 의료기관에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메뉴얼이 제시됐다.
왜 정책을 추진하는데 왜 전문가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사들은 늘 말한다.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기 전에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해달라고. 왜 의료계와 협의조차 없이 책상머리 정책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느냐고.
평소 의료계가 수 없이 제기한 의료정책의 구멍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