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MRI검사 급여확대? 건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나"
발행날짜: 2014-11-06 12:03:34
-
가
-
영상의학계 "환자 혜택은 좋지만 지속 가능성 없어, 병원만 피해"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고가검사 중 하나인 MRI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 추진을 두고 영상의학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환자에게 보장성 강화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반가운 일이지만,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그 피해는 의료기관이 감당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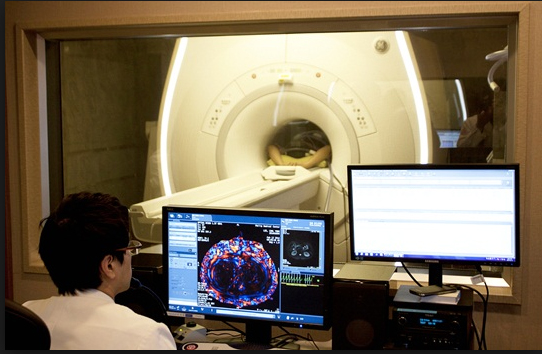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6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건정심 본회의에서 MRI검사 중 척추 및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퇴행성 척추질환, 어깨 병변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높거나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건보적용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연 1251억~1299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저수가 체계는 변함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던 영상 및 검사 영역까지 급여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한정된 재원에서 보장성만 높여놓고 그 이후는 나몰라라식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병원계의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과 한 임원은 "과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 사례를 보면 일단 급여를 확대했다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재정이 부족해지면 무더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식의 행태를 보여줬다"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몇년 전, CT·MRI 등 영상검사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건수가 급증해 건보재정 예산을 초과하자 삭감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 있다"며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가 인하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면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병원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은 "의료기관은 검사 수가를 인하한 것에 따른 경영 압박도 견뎌야하는데 삭감 폭탄까지 겹치면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지속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상의학회 김승협 차기 이사장은 "한국 의료시스템이 저수가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항목 덕분이었고 정부도 이를 용인했다. 그런데 수가는 그대로 두고 급여만 확대하면 답이 없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로 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이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게 환자들에게 이득이 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에게 보장성 강화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반가운 일이지만,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그 피해는 의료기관이 감당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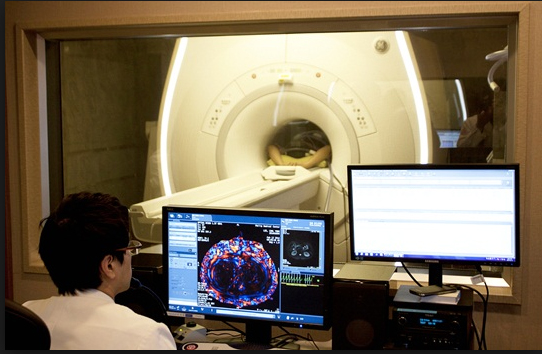
퇴행성 척추질환, 어깨 병변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높거나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건보적용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연 1251억~1299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저수가 체계는 변함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던 영상 및 검사 영역까지 급여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한정된 재원에서 보장성만 높여놓고 그 이후는 나몰라라식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병원계의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과 한 임원은 "과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 사례를 보면 일단 급여를 확대했다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재정이 부족해지면 무더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식의 행태를 보여줬다"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몇년 전, CT·MRI 등 영상검사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건수가 급증해 건보재정 예산을 초과하자 삭감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 있다"며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가 인하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면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병원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은 "의료기관은 검사 수가를 인하한 것에 따른 경영 압박도 견뎌야하는데 삭감 폭탄까지 겹치면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지속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상의학회 김승협 차기 이사장은 "한국 의료시스템이 저수가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항목 덕분이었고 정부도 이를 용인했다. 그런데 수가는 그대로 두고 급여만 확대하면 답이 없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로 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이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게 환자들에게 이득이 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초음파급여, 관행수가 20%수준…의료왜곡 우려" 2014-10-20 05:46:52
병·의원 기사
- 임대 1순위는 '병의원' 2015-02-23 05:10:23
- 국회서 시작된 차등수가제 폐지론…의료계 전반 확산 2014-11-06 11:45:55
- 건국대병원, 재난 대비 응급환자 진료 모의 훈련 2014-11-06 10:01:30
-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2014-11-06 09:58:56
- SCI-C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심포지엄 2014-11-06 09:56:19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NewsMain.jpg)









/NewsMain.jpg)

/NewsMain.jpg)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