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AI
- 진단
전문의 10명 중 7명은 놓치는 흡인 이물질 AI가 찾아준다
-
가
-
MedpSeg+합성곱 신경망 딥러닝 통해 CT 영상 분석
F1 점수 78%·정확도 91.4% 기록…영상 전문의 압도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조차 진단이 지연되거나 오진이 많은 방사성 투과성 흡인성 이물질(FBA)을 높은 정확도로 찾아내는 인공지능(AI)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조차 10명 중 7명은 놓치는 FBA를 90% 이상 찾아냈다는 점에서 합병증 예방에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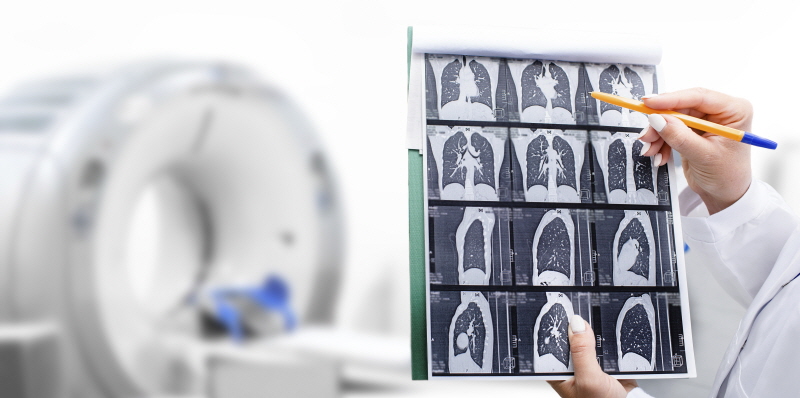
현지시각으로 13일 국제학술지 npj 디지털 의학(npj Digital Medicine)에는 방사성 투과성 흡인성 이물질을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검증 연구가 공개됐다(10.1038/s41746-025-02097-w).
이물질 흡인은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뷸규칙적으로 발생하며 즉시 진단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이 가장 먼저 이뤄지지만 방사성 투과성 이물질이 많다는 점에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특히 이 중 3분의 2는 마찬가지 이유로 CT를 찍어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기침이나 흉부 압박이 이어지다 급성 기도 폐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사우스햄튼대 왕이화(Yihua Wang)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를 찾아내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조차 이를 찾아내지 못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고정밀 기도 분할 방법인 MedpSeg와 합성곱 신경망을 통합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과 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인공지능 모델은 40세 이상 방사성 투과성 이물질 흡인 환자에게 91.4%의 정확도로 이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정밀도는 77.8%를 기록했고 재현율은 70%를 보였으며 인공지능 성능 지표 중 하나인 F1 점수는 73.7%로 집계됐다.
매우 높은 정확도로 이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높은 확률로 이를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와의 비교 결과도 압승을 거뒀다. 검증을 위한 비교 임상을 진행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년 이상 경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방사성 투과성 이물질을 36%밖에 찾아내지 못했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71%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F1 점수 또한 인공지능 모델은 90%를 기록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평균은 52.6%에 불과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이 누락 사례, 즉 위음성을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방사성 투과성 이물질을 찾아내 임상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왕이화 교수는 "지금까지 표준 영상 검사법으로 찾아내기 힘든 방사성 투과성 이물질을 인공지능이 높은 정확도와 재현율로 찾아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다기 보다는 빠르게 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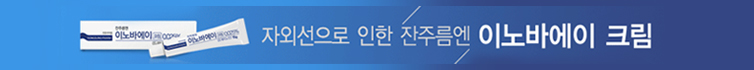
관련기사
- 서울대병원, 수술 합병증 3개 동시 예측하는 AI 개발 2025-11-10 10:02:34
- 미국심장협회 장식한 메디웨일…대규모 코호트 혁신연구 선정 2025-10-27 11:40:22
- GE헬스케어, 팬토믹스와 심장 검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5-09-29 10:46:11
- 만성→말기 신장질환 악화 가능성 이제 의료 AI가 잡는다 2025-09-11 05:30:00
의료기기·AI 기사
- 글로벌 진출 속도내는 웨이센…베트남 거점 마련 총력전 2025-11-13 12:03:07
- 의료기기 영역 넓힌 엔비디아…글로벌 기업 연이어 러브콜 2025-11-13 05:30:00
- 효용성 높아지는 심장 부하 MRI…진단 못한 협심증 잡아 2025-11-12 12:00:51
- 가정용 혈압계 새 역사 쓰는 오므론…판매량 4억대 돌파 2025-11-11 11:21:24
- 심전도만으로 수면무호흡 실시간 감지…새 AI 관심 집중 2025-11-11 05:30:00
의료기기·AI 기사
많이 읽은 뉴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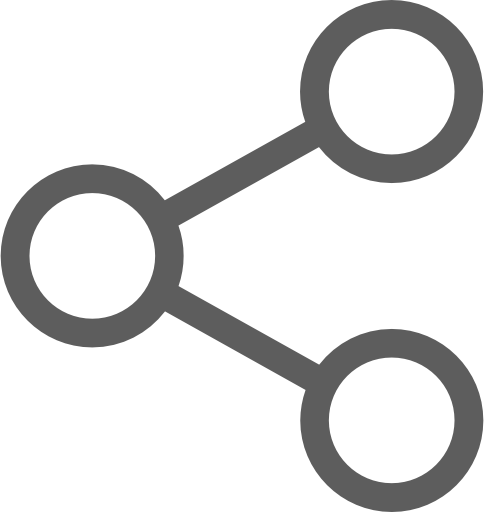








/NewsMain.jpg)



/NewsMain.jpg)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