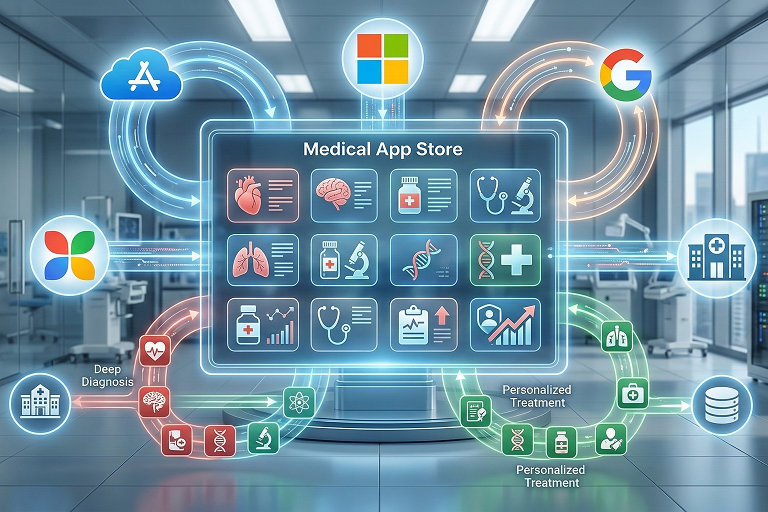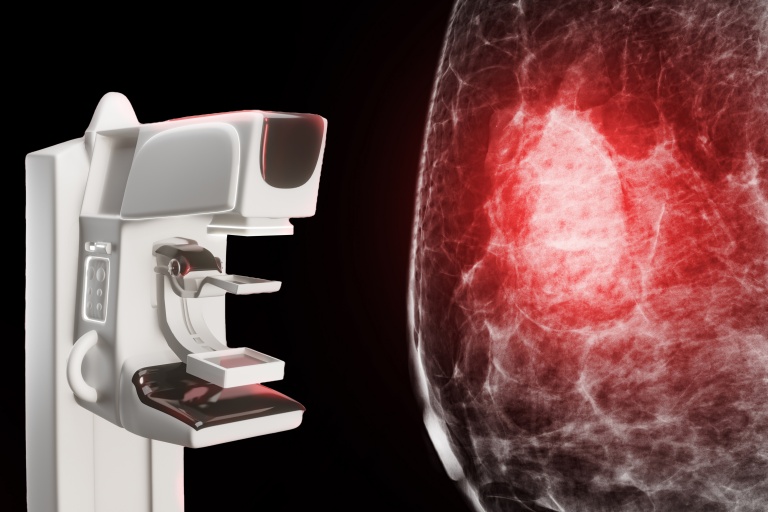국산 의료기기 글로벌 확산 기반 강화…정부, 교육·훈련 플랫폼 가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의료현장 도입 촉진을 위해, 의료진 대상 실습 및 제품 체험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13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9~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6)'에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제품의 의료현장 도입을 촉진하고 글로벌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산 의료기기 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의료현장 도입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홍보관은 임상 현장에서 활용 중인 국산 의료기기와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데 집중한다. 리브스메드, 메디스비, 메디씽큐, 스카이브, 아이도트, 알케이앰드메드, 에프씨유, 픽셀로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의 임상 활용 경험을 의료진과 공유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시장 진입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한다는 방침이다.교육·훈련 지원센터는 국산 의료기기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플랫폼이다. 현재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세의료원이 병원형 센터를, 성남산업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광역형 센터를 운영 중이다. 각 센터는 의료진 실습 교육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신뢰도를 축적해 왔다.해당 사업은 국내 확산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문의가 참여하는 실시간 시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과 한국 의료진의 정교한 술기를 결합해 임상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다.시장 진입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KHIDI 컨설팅 데이'도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와 202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상담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임상,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8개 분야에 걸쳐 기업별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현장에서 해소되지 않은 과제는 센터의 상시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후 관리를 지속한다. 진흥원은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교육·훈련 기반의 국산 의료기기 확산 모델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의료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및 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황성은 단장은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는 지난 7년간 의료진 교육과 임상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최근에는 해외 의료진 교육까지 확대되며 K-의료기기의 글로벌 확산 기반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훈련과 임상 활용을 연계해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확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